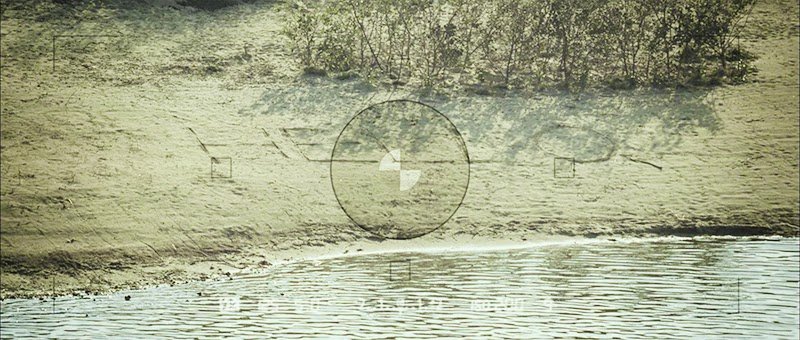
영화 “김씨표류기”나 “컨택트”에서 연출되듯 아무리 서로가 이질적이고 단절된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엔 소통에서 그들이 울기도 하고 또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니까요.
‘김씨표류기’에서 정재영과 려원이 HELLO를 주고받기 까지 그리고 ‘컨택트’에서 에이미 아담스가 외계생물과 첫 인사를 주고받기까지의 긴 여정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희는 다른 누군가와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만 같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빚어낸 그들의 HELLO 한마디는 마치 공포와 불안함의 우주를 탈출하고 지구에 발을 디딘 ‘그래비티’ 여주인공의 모습을 방불케 하니까요.
하지만 일상이 언제나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습니다. HELLO의 무게를 느끼기 전에 먹고 사는 무게에 힘이 빠지기 일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자로서 경험되는 사각 프레임의 영화와 다르게 일상은 고개만 휙 돌려도 떠올려지게 되는 파나로믹한 씬SCENE이 펼쳐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비록 가벼워도 순전히 반가운 마음에 나온 HELLO가 그 때의 커다란 풍경을 흐리게 하거나 선명케 하는 경우입니다. 가슴을 영화처럼 무겁게 때리진 않겠지만 오랜 인연의 더 넓은 프레임 위로 켜켜이 쌓이는 HELLO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르게 와 닿지요.
이 같이 HELLO의 무게는 상황마다 상이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같은 순간의 HELLO 만을 고대하고 있다가는 일상의 HELLO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일상의 HELLO만을 반복하다 보면 어쩐지 소통이 너무 가볍다고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HELLO를 해석하고 또 무게를 잴 수는 있으나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게 되면 HELLO의 본연인 소통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한 두 영화로 돌아가자면 ‘김씨표류기’와 ‘컨택트’는 사실 조금 다른 영화입니다. ‘김씨표류기’는 말 그대로 고립과 소통에 대한 미쟝센이 뛰어난 정서적 영화입니다. 반면에 ‘컨택트’는 삶의 희로애락을 초연하게 응시하는 태도를 가능케 하는 시간과 언어에 관한 철학적인 요소가 좀 더 짙은 지적 영화입니다. 하지만 두 영화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에 HELLO라는 같은 근본적 화두로 시작되어 진 것이죠. 이는 사실 글의 도입부에서 두 영화의 HELLO는 같은 것인 듯 포장되었지만 사실 다른 채널과 다른 무게로 시작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LLO. 참으로 다양한 방식과 무게로 표현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단절과 고립의 요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HELLO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은 힘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일상과 영화의 차이처럼 그리고 “김씨표류기”와 “컨택트”의 차이처럼 HELLO의 방식과 무게는 달라도 그 본연의 의미인 소통을 원함에서 통해질 수 있습니다. 무게와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요.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상대방이나 다가가고 싶은 상대방에게 무게를 버리고 진심이 담긴 HELLO를 건내보는게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