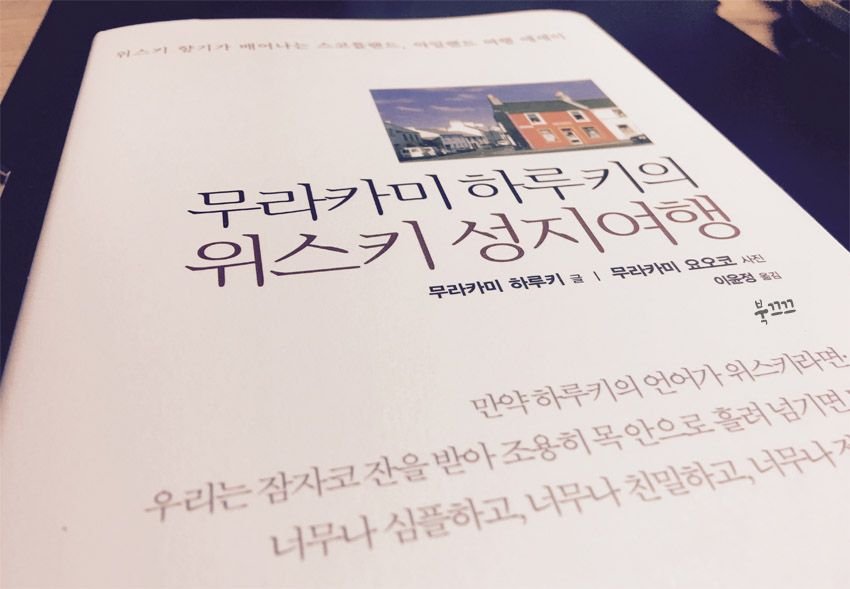
어떤 여행이라도 많든 적든 간에 나름대로의 중심 테마 같은 것이 있다. 시코쿠에 갔을 때는 매일 죽으라 하고 우동만 먹었으며, 니이카타에서는 대낮부터 알싸하고 감칠맛 나는 정종을 실컷 마셨다. 되도록 많은 양(羊)을 보고 싶어 훗카이도를 여행했고, 미국 횡단 여행을 할 때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팬케이크를 먹었다(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팬케이크를 질리도록 실컷 먹어 보고 싶었다). 토스카나와 나파밸리에서는 인생관에 변화가 생길 만큼 엄청난 양의 맛있는 와인을 뱃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독일과 중국을 여행할 때는 동물원만 돌아보고 다녔다. 이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여행의 테마는 위스키였다.
(중략)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처럼 고생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잠자코 술잔을 내밀고 당신은 그걸 받아서 조용히 목 안으로 흘려 넣기만 하면 된다.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정확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언어는 그저 언어일 뿐이고, 우리는 언어 이상도 언어 이하도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일들을 술에 취하지 않은 맨 정신의 다른 무엇인가로 바꾸어 놓고 이야기하고, 그 한정된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행복한 순간에 우리의 언어는 진짜로 위스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적어도 나는) 늘 그러한 순간을 꿈꾸며 살아간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면, 하고._머리말에서
_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여행
하루키가 쓴 여행 에세이다. 일전 하루키의 여행기를 읽고 나서 바로 구입한 책이다. 위스키를 먹기 위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간 하루키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도 가고, 오래된 바(BAR)에서 앉아 느긋하게 위스키도 마시며 어떻게 마셔야 위스키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도 말해준다. 머리말에서처럼 위스키를 먹으러 갔기 때문에 위스키 이야기밖에 없다.
잠시 술 얘기를 하자면 나는 낮술을 좋아한다. 처음 마신 낮술은 군대 백일 휴가를 나와서다. 집에 가기 전 동기들과 중국집에 들렸고 거기서 고량주를 마셨다. 취기가 오를수록 기분도 좋아졌다. 적당히 마신 술에 적당히 오른 기분,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까지. 어느새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 있었다. 이후 종종 기회가 되면 낮술을 했다. 취기가 오르면 질펀하게 늘어져 시간을 보냈다. 처음 그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지금은 낮술을 먹지 않는다. 회사에서 기회가 있어도 마시지 않는다. 낮술은 비단 먹고 나면 세상 다 가진 자처럼 여유로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취기를 이기고 일을 해야 한다.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짓 때문에 먹질 못하니 김훈이 말한 먹고사는 애달픔이 이런 건가 싶다.
앞서 말했지만 이 책은 위스키로 시작해 위스키로 끝난다. 하루키가 작정하고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만 쓴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개했던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같은 여행기를 바랐던 사람이면 읽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인지 나는 시종일관 몰입하지 못했다(라오스 같은 여행기를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위스키는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좋아하지도 않아 더 읽기 힘들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대상으로 썼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을지도.
사진이 많아 여행 에세이보단 사진 에세이에 가깝다. 하루키 책 중 사진이 가장 많은 책이 아닐까 싶다.

.jpg)